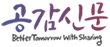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박재호 기자=경복궁역 2번 출구를 나오면 서촌이 시작된다. 지금은 유명한 서촌이지만, 청와대와 인접한 탓에 90년대에 들어서야 건축 규제가 풀렸다. 3~4층 높이의 빌라들도 그때부터 들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동네’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다. 전통 시장은 물론이고 오래된 서점, 이발소 등 정겨운 장소들은 서촌을 지키는 중이다.
이런 서촌을 거닐다 보면 치유를 받는 느낌도 든다. 광화문, 을지로 등은 물리적 거리로는 서촌과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다르다. 광화문과 을지로가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같다면, 서촌은 한적한 대나무 숲처럼 느껴진다.
물론, 서촌도 여느 유명 장소들처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겪었다. 많은 방문객이 찾고, 주목을 받으며 서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점점 서촌 외곽으로 밀려 나갔다.

새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만나분식’이라는 곳에도 다다랐다. 서촌 주요 상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서촌의 추억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등 주변 학교 학생들의 타임캡슐 같은 곳일 터다.
만나분식을 시작으로 하는 골목은 일반적인 주택가 같았다. 하지만 듬성듬성 카페와 식당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유난히 따스해 보이는 공간이 눈에 띄었다. 모란다방이라는 간판을 보고, 이 공간이 차나 커피를 팔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에서 착석이 불가하지만 추운 날씨 따뜻한 커피 한잔 들고 서촌을 걷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커피 한잔 포장을 주문해두고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다.
의자와 테이블은 생소하면서도 귀여웠다.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었는데, 옛 정서가 담긴듯했다. 벽면에는 한 남성의 젊은 시절로 보이는 사진들이 채워져 있었다. 천천히 그 사진들을 봤다. 아니, 읽어보았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남성의 인생사가 대략은 읽혔다.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소품에 신경을 쓰고, 큰 비용을 들이는 요즘 카페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겨웠다. 마치 예전부터 알던 공간처럼 느껴졌다.
모란다방은 커피에서도 옛 정서가 묻어났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커피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다. 커피 맛에도 시간이 담겨 풍부하게 다가왔다.

모란다방은 한 사람의 기억과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추억에 젖을 수 있게 된다. 오래된 것에 대한 케케묵고 자질구레한 집착. 간단히 표현하면 ‘빈티지(Vintage)’ 혹은 ‘레트로(Retro)’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서촌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부 주민들은 동네를 아예 떠나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추억보다는 매출이 우선되는 공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 금방 없어진다. 대형 자본들이 서촌의 추억들을 갉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다.
만나분식과 모란다방만큼은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10년, 20년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추억과 따스함을 찾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