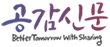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처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떤 도시를 가야하지? 스스로 삶의 터전을 고민하는 일은 꽤나 짜릿한 일이다. 각 도시의 정보를 찾아보며 그곳에 있는 나를 상상해보곤 했다. 브리즈번은 조금 따분할 것 같고, 시드니는 왠지 끌리지 않았고, 사막 지역으로 가자니 시끌벅적한 도시가 궁금했다.
그런 의미에서 멜버른은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했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기에 단번에 멜버른행 티켓을 끊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2월에 화이트 나이트 축제가 열린다는 것! 듣자하니 멜버른 도심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 된단다. 한국에서는 이런 축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음악 페스티벌 한번 가 본게 다 였다. 축제 당일, 한껏 부푼 마음으로 함께 사는 친구들과 거리로 나섰다.


축제 기간 동안 멜번 시티 안의 길들이 통제 되니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벌써 플린더스 역 주변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역을 배경으로 라이트 아트가 한창이었다. 라이트 아트는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어두운 멜버른이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니 원더랜드가 아닐 수 없다.
보통 페스티벌의 경우 이십대와 삼십대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 나이트에서는 남녀노소가 도시의 밤을 즐긴다. 다양한 이벤트가 골목, 공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는데, 예전에 와봤던 곳이라도 색다른 느낌이 든다. 춤, 영화제, 음악제, 거리공연 등을 보러 돌아다니면, 어느새 멜버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광화문 일대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삭막했던 고층 빌딩 위에선 라이트 아트가, 거리에선 음악과 춤이, 골목 사이사이 볼거리가, 광화문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문화 예술을 즐기는 장이되는 장면을.


한바퀴 돌고서 호시어 레인으로 가보았다. 우리에겐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유명한 곳이다. 일명 미사 거리. 옛날에 청년들이 하도 여기저기 그래피티를 해놓는 바람에 정부에서 ‘여기만 해!’하고 지정해 놓은 곳이라 한다. 덕분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도, 그래피티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멜버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다. 독특한 매력을 지녀 각지의 사람들이 꼭 한번 들르는 명소가 된 호시어 레인. 때가 되면 한번 씩 갈아엎기도 한단다.
축제가 한창인데도 한편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 새까만 목탄이 하얀 캔버스 위를 가로지르며 선과 면과 점을 드러냈다.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으로 작업을 하는 여자를 뒤로하고 호시어 레인을 따라 걸었다. 찬란한 색색의 그래피티가 벽면을 가득 메웠다. 어떻게 저기에서 그렸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높은 벽면에까지 그림이 자리했다. 찰리 채플린이 저 위에서 윙크를 한다.

다시 호시어 레인에서 나와 야라강을 향해 걸었다. 다리 위에선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야외무대가 꾸며져 있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각자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들의 아우라는 굉장하다. 신나는 음악과 춤을 추는 사람들. 우리 위로 선선한 새벽바람이 불었다. 호주의 2월은 초여름 날씨와 비슷해서 축제를 즐기기에 더할나위 없다.
공연이 끝나고, 새벽 내내 걸어다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고 일어나니 벌써 한낮이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가 넘치던 거리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다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축제는 열리지도 않았던 것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벌써 아득한 느낌이다. 한 여름 밤의 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