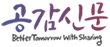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1) 차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과 같은 특유의 기품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차를 마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능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차를 선택해서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차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간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엉차‘를 많이들 마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효능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판매 싸이트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무실 근처에 있는 경동시장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우엉들이 지천으로 눈에 많이 띕니다.
주변국들에 비해 국민 1인당 차 소비량이 현저히 적은 우리나라지만 실은 도처에 차들이 넘쳐납니다.
결명자차, 둥글레차, 우엉차, 연잎차, 보리차, 오미자차 심지어 옥수수 수염차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 이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요.
茶나무는 카멜리아 신네시스(Camellia Sinensis)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茶에 대한 학술적 규정은, 학명이 Camellia Sinensis인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가공한 것을 이릅니다. 게다가 보이차의 원료이자 세계 모든 차나무의 모수(母樹)가 되는 운남대엽종은 카멜리아 윈난시스(Camellia Yunnannsis)라는 별도의 학명이 따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로 든 둥글레차류는 차의 범주 밖에 있으며, 엄밀하게 말해서 ‘차 대용음료’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 규정은 보이차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먼저 정리 했어야 논리적 순서에 맞지만 마음속에 따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지라 고쟁이 속주머니에 꽁꽁 싸서 아껴두었다 오늘에야 끄집어냅니다.

(2) 제가 茶와 茶대용음료를 구분 짓는 것은 양자의 격(格)을 달리 규정하여 차 아닌 것들을 배제하자는 배타적 의도가 절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茶대용음료들도 각각의 뛰어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기에 많은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 재화에 대해 강한 소비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인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茶든 茶대용음료든 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茶를 외면하고 茶대용음료를 쉽게 선택하게 만든 부정적인 요인이 우리들 내부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요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지나친 쇼비니즘을 꼽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身土不二라는 말이 급속도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자칫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가 “우리 것만 좋은 것이여!”라는 근거 없는 맹목적 애국주의로 변질될 경우 참담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친 쇼비니즘은 우리와 남을 구분 짓고 우리의 우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고립을 초래해 스스로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치와 茶文化가 비록 영역은 다르지만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이라는 비극도 결국 나치가 조장한 지나친 쇼비니즘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橘化爲枳(귤화위지) 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회강 이남[淮南]의 귤을 북쪽[淮北]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문화라는 것이 풍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한층 더 차원 높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탱자를 들여와서 귤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이고 창조적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昨今의 우리 茶文化는 身土不二에 의해 조성된 쇼비니즘에 기대어 안주하다보니 우리의 귤마저 탱자를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3) 소비자들이 茶를 외면하고 茶대용음료를 쉽게 선택하게 만든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은 지나친 形式主義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形式이란 것이 內容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茶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치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정신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순기능에 반해 그 지나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서기 힘들게 만든 장애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족두리 벗고 저고리 고름 푸느라 날이 밝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자어에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처럼 중국인들에겐 차를 마시는 일은 늘상 있는 예사로운 일입니다.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만 막노동꾼도 보온병과 차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시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짐꾼들도 슬리퍼에 런닝 차림으로 삼삼오오 땅바닥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茶가 성장(盛裝)의 예를 갖추어야만 대할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 다반사(茶飯事)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들 중에 현재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무관한 것들은 계승해야할 전통과 구별하여 인습(因襲)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된 이래 차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서민들이 차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오히려 차는 늘 지배계층에 의한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고 차문화라는 것 역시 지배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전유물로, 전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협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오늘날의 茶禮節이라는 것이 결국 과거의 이러한 지배계층만의 인습(因襲)을 답습(踏襲)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과연 훗날의 세대가 이어받고 싶어 하는 전통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까요?
원효대사가 당시 지배계층에서만 누리던 불교를 저잣거리의 동냥치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한 것처럼 차문화 역시 스스로 거추장스러운 예(禮)의 틀을 벗고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꾀할 때 대중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계승해야할 전통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큰 전제는 대중성(大衆性)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을 때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