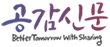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새벽 12시 45분,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렌터카 수령은커녕 버스도 끊겼으니 어쩔 수 없이 공항 노숙을 해야만 한다. 경비원들의 안내에 따라 페스티벌에서 나눠줄 법한 팔찌를 차고 게이트 옆 의자에 앉았다. 우리처럼 떠나지 못한 여행자들 또한 손목에 팔찌를 차고 저마다 자리를 잡는다. 이제부터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야만 한다.
공항 내 버거킹에서 허기를 채우고 아직 배터리가 넉넉한 노트북으로 영화 한 편을 보니 세 시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밝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잠을 자야 다음 날 차질이 없을 텐데. 억지로 잠을 청하지만 뒤척이기를 반복했다.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선잠을 자다가 결국 깨버렸다. 몽롱한 상태로 아침을 기다리는데 분홍빛 하늘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꿈을 꾸는 걸까, 잠시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떨었다.

황홀경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상쾌한 뉴질랜드의 바람 덕분인지 금방 기운을 차린 뒤 공항버스를 타고 크라이스트처치로 향했다. 처음 만난 크라이스트처치는 황량했다.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를 강타한 지진 탓이다. 당시 뉴질랜드 총리인 존 키가 “뉴질랜드 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말한 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지진이 지나간 흔적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사람들의 온기가 씻겨나가 냉기가 감돌았고, 멈춘 공사현장과 우두커니 서있는 빌딩들 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러나왔다. 버스 창밖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도시를 지나치며 영화 <나는 전설이다>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로버트 네빌이 개를 끌고 나올 것만 같다.
시간이 멈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시간은 2011년 이후로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트램이 지나던 길은 이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고, 멀쩡했던 길은 가로막힌 데다, 건물들은 무너진 채 뼈만 앙상히 남아있었다. 떨어져 나간 건물들의 잔해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숙소를 찾아 시내를 떠돌았다. 예약은 하지 않고 위치만 확인한 상태였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마다 폐업 중이라는 것.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다. 큰 도시에 숙소 하나 없겠냐는 생각이었는데, 그 하나의 숙소를 찾기란 호주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닐 때만큼이나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짐의 무게가 더해졌고, 공항 노숙으로 인해 조금만 더 있으면 길바닥에 드러누울지도 몰랐다.
일단 인포메이션 센터까지 힘을 내서 걸어가 보기로 했는데, 운 좋게도 친절한 주민을 만나 (이제 유일하게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중심에 있는) 숙소를 찾을 수 있었다. 백 미터만 더 가면 된다는 아저씨의 말이 어찌나 큰 위안이 되던지.
우여곡절 끝에 체크인을 하고 시내로 나가보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철조망에 걸린 아이들의 작품들이 조금이나마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이제는 머무는 곳이 아닌 지나치는 도시가 되어버린 크라이스트처치. 우리도 내일이면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난다.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시내를 산책하다 문득 깨달았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이전보다 조금 천천히 가고 있구나. 버스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공포감이 있었고, 침묵과 냉기가 감도는 건물들에선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버스 밖은 전혀 달랐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미처 보지 못했던 틈 사이로 새어 나온 사람들의 온기와 삶이 느껴졌다.
지금 크라이스트처치는 공사가 한창이다. 느릿느릿 그러나 차근차근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훗날 뉴질랜드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들의 시간은 얼마만큼 흘러 있을까. 다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시간을 여행하고 싶다. 그때는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기를...
[여행 시기는 2013년도이며 여행기에 묘사된 이미지들은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