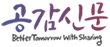신체 자유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 빈번해...영세·소액채무자 2만여명, 매년 구치소행

[공감신문] 최근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채무자 감치제도’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하고 강자의 편의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주민 의원 주최로 채무자 감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법안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초 채무자 감치제도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의 상환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현행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조치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감치제도는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수단이지만,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는 채무자의 빚을 상환을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제도지만, 현재 채무자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강자의 편의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치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채무로 인한 감치명령을 받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매년 2만여명에 달하는 국민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감치로 수용된 인원은 2만7261명에 달한다. 이밖에 2012년에는 1만8916명, 2013년 2만2599명, 2014년 2만1503명, 2015년 2만4896명이 남용된 제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문제는 수용되는 이들 대다수가 영세한 소액채무자라는 점이더. 이는 법안 도입 초기부터 우려돼 오던 점이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도입 당시 법무부 내에서는 사회적 강자인 신용카드업자,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제도를 남용해 영세 소액채권자를 강력히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감치제도로 피해를 당한 김 모씨가 참석해 본인의 사례를 소상히 설명했다.
22년 전 결혼한 김 씨는 남편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반지하 방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당시 심장수술에 이어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황장애까지 겹친 김 씨에게 찾아온 이들은 남편의 빚을 받기 위해 몰려온 채권자들이었다.
반지하방에 압류딱지가 붙는 모습을 보고 좌절한 김 씨는 딸과 동반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삶의 모퉁이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감치명령서’였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빚을 지고 그 돈을 못 갚은 저희들에게 죄가 내려진 것 같았다”며 “겁이 많이 나 울면서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에 의하면 김 씨의 사례는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며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빈번하다.
김미선 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 한 여성 채무자는 출산 직후 채무감치명령을 받고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둔 채 감치됐다”며 “전국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내담하는 이들의 60%가 무직자, 단순노무자며 가구소득은 70%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빚이 큰돈이 아닌 20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감치명령을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공무원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채무자 감치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