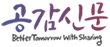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교양공감] 곧 졸업 시즌이 지나면 새학기가 시작된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입고 싶은 옷을 꺼내어 입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터. 전공으로 선택한 분야의 공부를 더욱 전문적으로 하며 교양을 쌓는 지식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이전부터 대학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라 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대학’이 존재했으며 왜 대학이라 부르게 된 걸까? 영어에서는 University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대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 공감신문 교양공감과 함께 대학의 역사, 문화를 비롯한 대학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 대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학의 형태와 비슷했던 기관은 중국 주나라 때의 국학과 기원전 387년경 세워졌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의 형태를 갖춘 것은 중세에 넘어와서다.

서양 중세 중기에 등장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초기에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초의 대학교라고 간주할 수 있는 기관들은 11~12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교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자유과 교육을, 전공과정에서 법학, 의학, 신학 교육을 실시했다.
중세에 탄생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과 프랑스 파리 대학이 꼽힌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대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볼로냐 대학은 법학과가 유명한데 그 배경은 볼로냐 지방이 법의 권력이 세었던 로마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 법률을 탐구하며 권력과 맞서왔었다.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의 대학교들은 대체로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삼았다.

반면, 유럽 북부의 대학교들은 파리 대학을 본보기로 삼았다. 파리 대학은 루이 7세(1137~1180) 당시 파리가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증설이 요구됨에 따라 설립됐다.
루이 7세와 필리프 2세는 지식인들의 활동여하에 따라 왕조의 권위와 힘을 고양하고 결집시키는 주요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문진흥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당시 파리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곳,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예술적 재기를 발휘할 수 있는 곳, 출세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났다.
■ 대학을 왜 ‘대학’이라 부를까
‘대학(大學)’이라 최초로 부른 것은 사실 일본이며 시초는 도쿄 대학이었다. 이후 한자 문화권에서 대부분 대학이라 부르게 됐다.
‘university’라는 단어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교사와 학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의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교사와 학자는 지금으로 치면 ‘교수’에 해당한다.
대학이 탄생한 배경은 가톨릭교회의 사제 양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니 대학의 역사를 쫓을 때 유럽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사제들은 교육을 마친 후에 다른 사제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교육 면허를 받았었다.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는 루트와 비슷하다. 이런 형태의 대학은 주나라의 국학이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다르다.
11~12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법에 강했다면, 훨씬 이전의 초창기 대학들은 신학에 강할 수밖에 없었다. 목적이 사제 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대학이 생겼을까
우리나라 역시 오래 전에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監), 신라시대의 국학(國學), 고구려의 태학(太學) 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균관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기관으로 '성균'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인 1289년으로 국자감을 성균감(成均監)이라 개칭한 데서 비롯된다. 1308년(충선왕 1년)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했다. 이후 공민왕 때 다시 국자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1362년에 다시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조선 건국 이후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치됐다. 조선왕조의 한양천도에 따라 한양 동북부지역인 숭교방 부근(현재 성균관대 위치)이 성균관의 터가 됐다.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최초의 대학은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다. 당시 ‘경기도 경성부’, 현재의 서울에 설립됐다.

여기엔 ‘제국대학’이라는 말이 붙는데, 제국대학, 즉 식민지 대학은 그 설립 목적이 확연하다. 초창기 대학들이 가톨릭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면 식민지 제국 대학은 제국주의 국가가 자기들의 체계와 역사, 식민으로서의 식민의식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초의 식민지 대학은 아메리카 대륙에 스페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영국 역시 인도에 5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일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에도 제국대학을 설립했었다.
■ 제국대학을 거부한다
물론 이런 식민지 대학을 당시 지식인들이 쉽게 받아들였을 리 없다. 하지만 일제 역시 다른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마냥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1945년 광복 전까지 다른 대학의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고 무조건 식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학생들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추진했으며, 의예과 등 타 전공 학생들을 포섭해 항일 학생비밀결사단체인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반제부)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설립 목표로 내세웠다.
■ ‘대졸 세대’들의 향연
6.25 전쟁이 끝난 뒤 전쟁 피해에서 벗어나며 경제가 회복되자 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전에는 남매가 많은 집이라면, 정말 공부 잘하는 자녀 혹은 장남만 대학을 갔었다.

이후 현대에 들어서는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고 저출산 영향까지 겹치며 대학 진학률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1990년 33.2%였던 진학률은, 2009년 82%로 급증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무조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난해 50%를 넘는 등 고졸 취업문화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또 대학 역시 자기 진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필요한 경우에 대학을 가려는 선진국과 같은 움직임도 더 많아지는 추세다.
■ 우골탑부터 시작된 등록금의 역사
1970년대 대학생들은 대학을 ‘우골탑’이라 불렀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끼던 소를 팔아 부쳐주신 등록금으로 다니는 대학이었다. 소의 뼈들이 그득그득 쌓여있다고 우골탑이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등록금은 큰 부담이다.

국공립 시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일반 대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대나 이공계, 예술계열의 학생들의 경우라면 더 더욱 그러하다.
약 10년 전부터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많은 학생들은 제도를 통해 낮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사회인이 된 다음에 천천히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취업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청춘들이 직장에 자리를 잡을 때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기대감보다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때문에 많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빚’을 얻는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낀다. 졸업 후 사회에 나온 뒤에는 대출금 상환에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돈을 벌어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 돈을 모으지 못하고 그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다 써 생활을 빠듯하게 만든다.
■ 대학보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중요해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서울대학교를 꼽을 것이다. 단과대학이 독립돼 설립된 경우가 많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종합대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서울대는 종합대학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100위권 안에 진입한 대학이며 2005년 93위, 그 다음해엔 63위로 매년 빠르게 순위가 성장해 2014년 31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과학, 법학, 의학 등 주요 분야에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다.

이전에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들으면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최근엔 서울 ‘대학교’가 아닌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진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중’과 같은 학교에 대한 입시 열풍만 봐도 그러하다.
일찍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도 많아졌는데, 이전처럼 외국의 대학을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외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해졌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이후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며,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재’라 말할 순 없다. 이제는 자신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학이 아닌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자
우리나라 의무교육 과정은 전반적으로 대학으로 가는 입시 교육 과정 위주이다. 요즘은 특성화나 실무교육 위주의 과정도 많지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인문계 교육 과정을 선택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2년의 시간 동안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써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인생의 첫 단추로 여기는 이들이 많지만 이 첫 단추를 끼운다하더라도 대학 4년을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이란 것을 쌓기 위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잠 못 자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은 결국 취업을 위한 또 다른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대학을 단지 취직을 위한 '스펙' 쌓기 공간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4년간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비해 큰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대학에 더 이상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게 좋다.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대학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느 때처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3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의 가슴엔 그 누구보다 빨리 반가운 꽃을 피울 것이다. 새내기들과 새내기였던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따듯한 봄날을 맞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