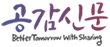은행 영업 차질 없어…‘금수저 파업’ 비판 높아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금융노조가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명분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다. 성과연봉제는 이유가 될수 있지만, 관치금융 철폐는 노조의 영역이 아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금융노조 추산 5만명이지만, 정부가 추산하기로 2만명 정도다. 숫자가 중요하다. 파업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느냐에 달려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단기 실적주의가 만연해 금융 공공성이 무너지고 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의 의도와 달리 이날 은행 창구는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대다수 창구 직원들은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는 있었지만, 창구를 지키고 있었다. 고객들의 불편도 크지 않았다. 당초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10만명이 결집, 은행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 예고했지만, 영업점 현장에서는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됐다. 특히 영업 점포가 많은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등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3% 내외 수준이어서 은행 영업점에선 파업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다고 한다.
금융노조는 왜 파업을 했나. 파업 참가자들이 없어도 은행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파업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파업장소 참가 노조원들이 없어도 되는 인력임을 보여준 셈이다.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정부의 요구대로 성과급제도를 한다고 우리 금융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늘어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저하는 정책성 금융에 있다. 때론 은행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금융인들이 외적 상황을 핑계삼아 안주해왔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OECD 국가 가운데 시중은행에 노조가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라는 울타리를 방벽삼아 밥그릇 챙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게 솔직한 국민적 심정이다.
금융공공기관과 시중은행원의 평균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1억700만원, 수출입은행 9,543만원, 산업은행 9,385만원, 한국은행 9,667만원, 금융감독원 9,574만원 등이다. 민간은행에서는 씨티은행의 직원 연봉이 9,100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 뒤를 KEB하나은행 8,500만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8,200만원에 달한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한 시민은 "성과제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그래도 일하고 싶은 사람 엄청나게 많다"며 "돈을 많이 받으면서 파업에 나서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노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돈도 많이 받는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는 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 변화로 이젠 은행 점포가 필요없는 시대다.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경제생활에 전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밤 늦도록 돈을 세고 주판을 두들기던 시대는 아니다. 은행원들도 달라져야 한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원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져,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문제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성과급제 반대의 논리로는 적절치 않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7월, 2014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금융노조의 파업은 실패했다. 비상시에 대비해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한 은행이 없었다고 한다. 금융노조는 식어가는 동력을 다시 살려 다시 파업을 하든지, 개별은행의 성과급 제도를 묵인하든지,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