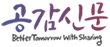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지해수 칼럼니스트=내가 초등학생이었던 90년대 말 즈음, 아이들이 받는 방과 후 예체능 과외는 피아노나 태권도 정도였다. 좀 더 관심이 있는 애들은 바이올린이나 서예, 합기도나 무용 등을 배우기도 했다. 학습 시설이 지금보다 부족했을 뿐더러, 예전 ‘초딩’들에겐 좀 더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물론 스마트폰도 없었으며 모뎀으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이다.
게다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체능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드라마 <SKY캐슬>에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우리 때에도 매우 중요한 목표일뿐더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큰 결정권자같이 여겨졌다. 교회 목사님은 시험 기간마다 주일 예배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투덜대셨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건조한 10대를 보내진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안 그래도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너무 많이 감상을 하고 자라서 지금도 성격이 감상적이 된 것 같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안했던 던 사실이다. 그래도 중학교 땐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중간만 하고 내가 할 다른 걸 하자고 생각했다.
아마 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화와 연극을 봤던 것 같다. 나중엔 볼 공연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싸이월드’에서 내가 쓴 영화나 연극 리뷰들이 인기가 좋았다. 겨우 고1, 2밖에 안된 내가 혼자 연극을 보러가서는, 연극영화과 과제로 제출해도 손색없을 관극평을 올리곤 했다. 해당 극단 관계자들은 내 리뷰를 ‘스크랩’하였고, 그 다음 공연의 티켓을 선물해주곤 했다. 물론 이런 식의 관람은 지속되었다. 영화 잡지 사이트에 응모해서 정말 많은 영화의 시사회도 갈 수 있었다.
그 때 내가 영화나 연극을 봤던 건 사실 일종의 회피였다. 영화나 공연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 매니악하게 쫓을 정돈 정말 아니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한번씩 그러는 것처럼 가수든 탤런트든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러다가 연기에 매력을 느껴 진짜 배우가 되고 싶던 시절이 있었다. 집에선 반대를 했다. 차라리 작가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다. 영화나 연극을 보는 건 뭐랄까, 시대의 많은 것을 느껴야할 것만 같은 작가 지망생에게 꽤 어울리는 취미였다. 물론 맨- 심각하거나 철학적이거나 우울하거나 고전적인 작품들 천지였다.
십대의 내가 다른 것들을 취미삼거나- 아니 취미 삼을 여유가 없었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꼽는 인생의 드라마들이 꼭 10대에 본 것만 있진 않다. 하지만 그런 어떤 취향을 가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10대에 본 것들이 차곡차곡 마일리지처럼 쌓였던 거다. 어느 작품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게이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간 목적지에 내리지만 그 여정이 다르게 느껴질 순 있다. 쌓아놓은 마일리지 덕분이다.
물론 그 때 공부하지 않았으므로 난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했다. 만일 되게 아쉬웠거나 그 점이 콤플렉스였다면 준비를 잘 해서 대학원이라도 좋은 곳을 가려고 했을 거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또 다른 공부를 해야한다고 느꼈다. 좋은 것을 아는 공부다.

한 여성분에게 SNS를 통해 ‘어떤 남자를 만나야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너무 어렵다고 답했다. 근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1로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가 제일 먼저이기에 ‘어떤 남자’라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다. 왜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지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 결론이었다. 왜? 안 좋아하면 못 만나겠으니까.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 사랑에 빠지는 것에 있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어떤 종류의 사랑이 나와 잘 맞는지-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인지- 좋은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는 있다. 매우 이상적인 부모님을 밑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 수도 있고, 드라마나 소설, 영화들을 통한 간접적 경험- 그리고 실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에게 좋은’ 남자를 알아가는 거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나쁜 사람’ 음, 아니 사람 말고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를 해야 내 비유가 편할 것 같다.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는, 좋은 영화도 나쁜 영화도 많이 봐야한다. 하지만 좋은 영화를 훨씬 많이 본 사람이 좋은 영화를 만들 확률이 크다.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좋은 음악을 만들 확률도 크다. 뭐가 좋은 건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자신이 실물로 보지 못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이름을 듣고 군침을 흘리는 사람은 없다. 좋은 것에 둘러싸인 환경이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취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얻은 취향에 대한 깊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 좋은 것을 아는- 교육.
그리고 이건 정말 인생에 있어 몹시 중요한 교육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 입시학원이 장차 누군가가 돈 버는 것에 큰 영향을 줬다면, 취향에 대한 교육은 인생을 살며 돈을, 시간을, 감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0대에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우린 앞으로 몇 십 년은 더 돈 벌고- 더 소비할 것이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계속 벌고 계속 쓸 테지. 그러니 계속, 좋은 것들을 알아가야 한다. 나에게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거 말고, 좋은데- 나한테 오면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

최근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식이요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이나 자연식은 ‘좋은 것’일수 있지만 나의 생활패턴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덕분에 좋다는 것 안에서 내가 맞는 게 뭔지 계속 스스로를 시험해볼 생각이다. 스스로 더 좋아지기 위해 좋다는 것들로 마루타를 삼으니, 내 몸도 그 전보다 좀 좋아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