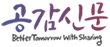커피는 여유다. 그래서 여유속에 커피가 있는게 아닐까?
[공감신문 신도연칼럼] 춥지만 바람의 내음이 다르다. 웅크린 겨울속에 때이른 봄 바람 내음이다.
며친전 출근길에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른 봄의 향취가 어제와 다르게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다.
회사 앞 작은 언덕에 올랐다. 산책길에 삼삼오오 어르신들의 발길이 봄을 향해 가는 듯 조금은 가볍게 느껴진다. 개나리는 군데 군데 몽우리를 품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곳에서는 무수한 꽃봉우리가 땅을 향해 떨어지는 봄이 오겠구나 싶다.
내가 무거운 머리를 싸메고 좋은 글을 쓰고 싶어 애썼던 그 시간들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신은 인간에게 참 좋은 것을 보여 주시는 구나. 위대함의 극치를 보는구나” 싶어 절로 고개가 떨구어 진다.
그런데 여전히 허전함은 가시지 않는다. 순간 커피를 탐욕하고 싶어진다. 이럴때 쓰다쓴 커피를 탐욕하며 마신다는 것이 순간의 제격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 옆에 보이는 자동판매기에 눈을 돌렸다. 고마웠다. 바로 내 옆에 있어줘서.

언제나 사사로운 내 곁을 지켜주는 한잔의 커피가 비싼 아메리카노가 아닌 뜨뜨미지근하면서 달짝지근한 커피가 옆에 있어 주다니. 이내 한잔을 들이키는 순간 커피는 온몸으로 퍼져 나의 몸에 엑스터시를 제공해 준다.
학교 다닐 때 필자는 지독한 ‘책벌레’였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책만 보는 무식한 책쟁이였다. 주어진 24시간을 최대한 늘려 보려는 심산에 잠을 자는 것도 잊고 책을 본 적도 많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때임에도 책을 읽었다.
그것도 무수히 어려운 단어와 문자들로 가득했던 고서와 중세에 발간된 책들을.
그날도 학교 한구석 벤치를 점령하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발견한 캔커피. 나도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싶었다. 마셨다. 파르다란 캔커피 유혹에 그만 빠져 들고 말았다. 잠도 오지 않고 별로 유쾌하지 않는 반응을 시작으로 그날 밤 그렇게 책을 보는 재미에 커피가 끼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 커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달달하면서도 썼던 그날의 커피 맛도 매력적 이었다 아니 나에겐 효과 만점의 반응 이었다.
순간 카페인이 몸을 감싸고 돌다 순간 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뭔지 모를 커피의 순환 운동.

여기에 담배와 와인 그리고 커피. 이 세가지는 필자가 늘 기호품으로 애용하던 것이다.
담배는 이별 선언으로 떠나고 와인은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아 버리고 이제 남은 건 커피 뿐이다.
아무리 바쁜 일상도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만나러 오는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난 서스럼없이 내가 좋아 하는 커피를 제공한다. 그건 나와의 교감을 시작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다.
차려 입은 모습을 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마시는 우아한 헤이즐럿도 좋고 사람들과 어울려 고기집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식후땡을 마시는 믹스 커피도 좋고 바쁜 일상 속에서 후배가 건네주는 스타벅스의 별 그림 커피도 좋다.
그 중에 가장 맛난 것은 내가 손수 종이컵에 물을 맞춰 타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
나만의 커피 레시피로 만들어진 것이라.
마감을 앞두고 종종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이면 책상 가득 마실 커피가 종류별로 널부러져 있다.
원고 마감이라 화장실 가기도 바쁜 날임에도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종종 식어버린 모양새로 색다른 맛을 선사하기도 한다. 25년 이상을 나의 분신처럼 함께 지내온 커피임에도 아직도 커피의 맛이 낯설때가 있다.
그건 식거나 뜨겁거나 미쳐 내가 마셔보지 못한 커피를 접할 때 그렇다.
커피는 여유다. 여유를 부릴 때 가장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피다.
커피가 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부려 보는 여유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복이자 사치다.
오늘도 반갑지 않은 황사가 찾아왔다. 청명한 아침을 보기란 글렀다. 그래도 기다리는 것은 커피가 있고 봄이 있다.
여유 있게 마실 봄의 커피를 기다리는 것이 허욕을 아닐텐데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꿈을 꾼다.
커피가 있는 오후를....그리고 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