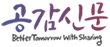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지해수 칼럼니스트=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술을 잘 마실 수 있느냐, 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아니, 자주 들었었다. 물론 과거 체력이 좋을 때의 이야기다(...) 이건 내가 정말 남들 눈에 물리적으로 ‘내일이 없는 것 같이 마신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휴가 나온 군인처럼,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마시는 것 같이 보였나보다. 전혀 아니었다. 열정이 아니라, 그렇게 마셔도 내일 하루를 또 일상적으로 살아낼 만큼 회복이 빨랐던 거다. 주당들은 대부분 해장의 고수들인 경우가 많다.
최고의 해장 음식이 무엇이냐에 대해 늘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진짜 주당들은 저마다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해장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맑은 국물로 해장하는 걸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평양냉면!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일단 물냉면이나 쌀국수로 해장한다. 탄산수와 커피로 즐겨 마시는데, 위 건강을 위해 과음한 다음 날은 줄이려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블랙커피를 마신 후 낮잠을 자면 더 피로가 잘 풀린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생 한나는 최근 주량이 늘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집에 올 때면, 드라마 속 회식한 아버지가 두 손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들고 귀가하듯 우엉차와 스포츠음료를 사온다. 그게 비결이라고 했다. 스포츠음료는 빠르게 전해질과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도 다시 빼낼 수분을 생성해주고(...) 심지어 당분으로 인하여 뇌가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외에도 초코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피자와 같이 기름진 음식으로 해장한다는 이들도 있다. 매운 짬뽕 국물로 땀을 쫙 빼는 게 좋다는 주당들도 상당히 많다. 우리 아빠는 다음날 등산을 하거나 반신욕을 해야 해장이 된다고 하셨다. 수분과 당, 순환을 돕는 휴식이 공통된 주당들의 해장 교집합이다.

해장, 도대체 인간에게는 왜 해장이 필요할까? 인간은 왜, 해장이 필요할 때까지 술을 퍼마시는 걸까? 어느 날 주말 오후에, 아는 영화감독님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너 어제 많이 마셨니?’라고 단번에 물으셨다. 전날의 기록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이란 참 지독한 존재지.’라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간이 왜, 해장이 필요할 때까지 마시냐고? 그건 이별할 건데 왜 사랑에 빠지냐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때때로 자주 필요하지 않나, 정신적 피난. 나는 무언가를 타지 않고는 일상일 살아내는 것이 가끔 너무 힘이 들어서.
해장을 이별과 비교하다니 감정이입이 심하다 할 수 있겠다만, 나도 말하고 놀랐다. 해장의 원래 어원은 ‘해정’이었다고 한다. 정을 푸는 것이다. 여기서 정은 사랑을 뜻하는 연정과는 다른 한자어인 숙취, 술병이라는 뜻을 가진 정(?)이다. 말장난을 치자면 정(情)을 푸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전날의 술로 주접을 떨었던 감정들을 해소시켜야지, 과하게 친한 척을 하고, 과하게 사랑을 고백했고, 과하게 시니컬했고, 과하게 신났고, 과하게 용감했던 전날의 민망한 내 모습과 화해를 해야지. 해소해야지!

그래서 일까... 우리가 선호하는 해장음식들은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드문 것 같다(평양냉면만 빼고). 못생김의 대명사 같은 해산물인 오징어가 잔뜩 들어간 매운 짬뽕도 사실 ‘입맛 땡기는’ 비주얼일 뿐,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는 별로인 편이다. 똠얌꿍도 좀 그렇게 생겼다. 숙주들이 뻣친 머리카락마냥 헝클어지는 쌀국수도 그렇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전날의 나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속을 푸는데, 해장국 너는 세상 밖 사람들처럼 멀쩡하고 피부도 뒤집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다. 그러니 해장음식들은 좀 못생겨야 인간미가 있는 느낌이랄까.
전날의 기억을 하나 둘 꺼내며, 혼자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해지다가도 ‘아, 그래서 뭐 어쩌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음에 조심해야지’ 생각하게 된다. 인생은 원래 저지르고 보는 거지. 아 물론, 남들한테 피해가 갈 만한 일들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해장이 되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똠얌꿍’을 발음할 때처럼 뻐근했던 온몸의 근육이 어느 순간 괜찮아져있고, 침침했던 눈도 좀 밝아진 것 같고... 파도가 머물다 간 바다 같이 고요한 장기들... 그럴 때다. 아니 언제 그렇게 되었지? 하고 깨달을 때다.

진짜 주당들의 문제는 이런 깨달음을, 해장술 중간에 느낀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또 술이 들어가지, 난 미친 게 분명해- 라면서도 어느 순간 전날과 같은 속도로 잔을 비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위스키를 몇 잔 마신 것처럼 뻐근했던 몸들이 어느 순간 괜찮아져있고, 침침했던 눈도 좀 밝아진 것 같고... 파도가 머물다 간 바다 같이 얌전한 장기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는 게 가장 빠르듯이 음주와 해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꺼번에 올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사실 몇 주 전 ‘술 칼럼’을 써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술이 싫어서’라고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걸 잊고 다른 주제의 칼럼을 써버렸던 거다. 또 그 때의 나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술과 나, 우리 둘의 사이에 해장이 다 끝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