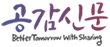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지해수 칼럼니스트=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현대인들에게 ‘제 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 제1의 장소는 집처럼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며, 제2의 장소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 혹은 학교와 같은 목적을 가진 곳이다. 제3의 장소는 목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다. 즉, 호모 루덴스적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영역인 것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던 놀이터도 그 중 하나였다. 놀이터는 마치 아이들을 위한 곳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은 ‘엄마’들의 ‘제 3의 공간’이기도 했다. 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휴식을 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 3의 공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 곳을 제 3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들에 한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야기다. 입장료가 비싸거나 꼭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거나 외모가 출중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제 3의 공간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차별성이 있기에, 누군가는 그 곳을 편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성을 존중하며 탄생한 개념인 ‘제 3의 공간’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대성을 존중한다.
나는 예전에도 ‘제 3의 공간’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당시의 나를 비롯하여)은 ‘제 3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썼었다. 단순히 ‘아지트’라 부르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던 와중에, 누군가가 ‘제 3의 장소’라는 개념을 썼음을 알게 되었던 거다.
어찌 됐든 당시 나는 제 3의 공간에서 행복했던 게 사실이다. 당시 나에게 제 3의 공간은, 휴식을 주고, 창조할 수 있는 영감을 주며, 사유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썼더라. 그 안에는 (눈에 띄는)서열이 없었고, 소박하거나 혹은 격식이 없었으며, 자유롭게 수다를 떨 수 있었다. 또한 먹고 마실 만한 것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몇 년 만에 내가 이 개념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시 공간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보면서부터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달랐음은 알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 주장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거리를 가지며, 변화하지 않을뿐더러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랬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렇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은 그것을 측정하는 대상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느끼는 대상인 ‘나’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저 ‘느낌적은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 공간 자체가 휘어져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하자면 너무 힘드니,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또는 ‘지해수칼럼> 지해수 칼럼-뉴욕에서 고양이 꼬리를 당기면 LA에서 야옹하겠지’를 찾아보시길(...)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시 공간은 절대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것들은 섞일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크게 작용한다. 나는 이 의견에 완전 공감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라면 시간은 절대 공평하지 않고 상대적이다. 몇 년 전 이 개념에 완전 쇼크를 받은 나는, 그가 말했던 개념을 이용하여 시간을 써보았다. 이를테면 느리게 시간이 가는 시공간에서는 꼭 처리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일들을 하곤 했다.

나는 요즘 거의 집 밖 외출을 하지 않는다. 나에겐 제 3의 장소가 사라졌다. 언제라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유와 행복을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걸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다. 요즘 보니, 현대인들에게 ‘제 3의 장소’는 다만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각하는 아인슈타인처럼, ‘절대 장소’ ‘절대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제 4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얘기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간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내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나 해내는 것들은 정말 위대한 것들 투성이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모든 것들은 흘러가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옆에 오고, 붙잡아도 흘러간다. 하지만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어느 시공간에 존재한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순간’을 만끽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거부당한다. 의식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훈련되어지는 것 같다. 당장 지금을 알아차리기 전에 다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의식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제 4의 장소이다. 제 3의 장소를 피력한 책이 나왔을 때 사회의 이슈는 ‘힐링’쪽에 가까웠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아직도 선명하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내고 IMF를 극복해낸 현대인들에게 TV광고에선, ‘떠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힐링’은 거대한 마켓이 되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팔렸으며, ‘힐링’이라는 이름을 단 재화나 서비스가 불티나게 팔렸다. 관련된 문화 행사들엔 명사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인기도 높아졌다.
힐링은 말 그대로 ‘치유’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사회의 어느 단면에선, 그러한 진통제를 계속 팔고 있더라는 것이다. 진통제에 중독된 어떠한 청년들은 계속 ‘힐링’만을 찾으며 없던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사회는 청춘에게 힐링을 팔고 있더라는 거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어떤 이들에겐 힐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꼭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행을 가거나 소확행스러운 아이템을 자신에게 선물해야 힐링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마치 그래야할 것 같은 분위기가 꾸며진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서 굳이 지금 여행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뭔가 ‘인생을 빡세게 사는 사람’처럼 보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다.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주는 ‘제 3의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는 나에게 ‘제 3의 공간’이었던 곳에서 혼자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았던 같다. 왕따였냐고? 함께 있던 이들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보편적인 것이다.
‘지금 **이가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봐봐.’
우리는 같은 무언가를 공유한다. 나름 시공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진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런 목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제 4의 그레이트 플레이스’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 곳은 우리 의식에 휴식을 주고, 창조할 수 있는 영감을 주며, 사유하게 하는 장소, 혹은 시간 일거다.
만일 누군가와 함께여도 마음이 쉰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금 동떨어져서 자신의 의식과 함께 제 4의 장소로 떠나보시길 권해본다. 종교가 없더라도, 기도 역시 그러한 의식 중 하나일 것이다. 명상이 대표적일 수 있다.
행복해지진 않더라도 조금 더 분명해진 스스로를 만나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