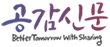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김찬 칼럼니스트= 얼마 전 한 대학의료원의 기술사업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창업 전에는 본업인 연구와 진료 등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던 분들이 창업 이후 본업에 소홀해졌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대학에서 창업 교수가 창업 이전에 달성했던 본업(교육·연구·진료 등)의 성과 80% 또는 비(非)창업교원의 평균 성과 80% 이상을 내지 못하면 겸직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교수 창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대학의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와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수 창업 수가 미국보다 각각 3.8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국가 규모 고려 시 한국의 교수 창업 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1위 이스라엘)인 것에 비해 한국의 기술창업 비중(최근 3년 평균 약 1.7%)은 여전히 미국(2.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그래서 국내 기술창업에서 교수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교수의 본업은 교육과 연구다. 만일 의과대 소속 교수라면 진료도 추가된다. 창업은 아무래도 본업에 영향을 준다. 성실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은 대학교수 창업 시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상임직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만 1주일에 1일 본업 외 겸직 활동이 가능하다. 그 외 대학에는 겸직 활동에 시간제한이 없다. 반면 미국은 서울대처럼 주당 1일로 근무시간 제한을 두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상임직이든지 비상임직이든지 주당 1일로 본업 외 근무 규정에 제한을 둔다. 휴직도 단기 1년만 허용하고, 상임직은 오직 안식년에만 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벗어날 경우 이에 상응해 급여 등을 깎고 겸직교수로 직무 전환을 한다.
사실 국내 기술창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면서 성장한 측면이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창업 비중을 높이려다 보니 기술사업화에 대한 경험도 없고 준비가 안 된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를 독려했다. 그 결과 선진국 대비 낮다고는 해도 최근 10년간 기술창업 비율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대학교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 교수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될 때마다 “왜 한국 과학계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나?”라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짧은 기초 연구의 역사와 단기간의 목표에 치우친 연구 과제 지원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기술창업을 하게 되면 기초 연구는 사실상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상용화 개발 중심으로 R&D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창업 활성화가 미래의 노벨수상자가 될 유능한 과학인재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은 본업(교육과 연구)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창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의 기술창업은 투자자(AC·VC)와 좋은 기술을 가진 교수(과학자)가 처음부터 함께 기획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과학자)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자문에 집중하고 경영은 투자자 그룹이 추천·영입한 전문경영인이 한다. 오랜 기술창업 경험을 통해 가장 시너지가 나고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기술자(과학자), 투자자(AC·VC), 전문경영인(CEO)이 함께하는 기획창업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비상임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창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적다. 실패해도 재산이나 신분상의 타격이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창업기업의 목표가 대기업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나 M&A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목표를 더 분명하게 하므로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절감된다.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가 돼 직접 시장에서 검증 기간을 겪으면서 일정 기간까지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지난 칼럼(‘[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2] 베이스캠프가 중요하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2개 정도 팀이 정복하던 에베레스트산을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500개팀 이상이 정복하게 된 비밀은 베이스캠프에 있다. 베이스캠프의 위치를 크게 높인 후 베이스캠프부터 정상까지 6시간 거리마다 미니 캠프를 설치하고, 등반 과정의 돌발상황(날씨·건강 등)에 대응한 전략을 같이 짜는 지원팀의 역할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대학의 기술창업도 이런 베이스캠프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이 돼야 한다. 교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창업이어서는 안 된다. 창업 이전 단계부터 투자자(AC·VC), 교수(과학자), 전문경영인 모두가 참여하는 베이스캠프가 꾸려져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정상까지 올라가야 할 지를 함께 검토하고 기획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 또한 창업 후에도 로드맵을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대응한 전략을 같이 짤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대학의 창업지원 조직은 등반팀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베이스캠프처럼 변해야 한다. 아무쪼록 제도 정비 등과 함께 대학 창업지원 조직의 베이스캠프화가 계속 되기를 기원한다.
글 김찬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관련기사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2] 기술창업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중요하다.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1]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기대
- [김 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0] 벤처기업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9] 데이터 산업에서의 주요 이슈 점검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스톡옵션의 활용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벤처기업의 맞바람(역풍)과 뒷바람(순풍)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무형자산에도 부채가 생길 수 있을까?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의사의 바이오 스타트 창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창업 동기가 중요하다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3)] 자산변동성의 헤지(hedge), 마일스톤(Milestone)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공동연구에 앞선 상생 협약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4] 기술상용화를 위한 창업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5] 누바 아페얀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 [김찬의 기술창업이야기 16] 바이오산업의 디지털기술에 대한 단상(斷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