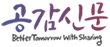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지난 3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코 3명의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이튿날 대다수 언론은 날선 비판의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현역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개개인을 대통령 특보로 기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거스르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본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당 내에서 나름대로 입김을 발휘하는 ‘실세’ 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를 맡게 된다면 과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위해서는 중매에 나설 인물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중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는 대통령 주변에 널려 있다. 왜 꼭 현역 의원을 기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당 내에서도 다분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누구인들 장관을 비롯해 멋진 감투를 준다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더군다나 정치인은 권력을 쥐면 쥘수록 더욱 더 권력 가까이로 다가가고 싶은 습성을 지니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들의 입각(入閣)이 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출신 3명이 총리(이완구)와 부총리(황우여·최경환)에 임명됐으며, 여당 의원 3명(유기준·유일호·김희정)도 장관직을 겸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임명된 3명의 정무특보까지 더하면 모두 9명의 현역 의원이 ‘투잡(two jop)’을 뛰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모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다. 이들에게는 중앙정치를 통한 경력관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를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굳이 이렇게 할 일 많은 현역 의원에게 감투를 씌워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총리나 장관에 임명할 인재 풀(pool)이 그렇게 좁은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