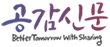이별의 끝에 서서 나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 않을 것이다
[공감신문 신도연칼럼] 만남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이별이라는 존재.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염 없이 지켜보는 것은 하늘 뿐이다. 하루를 살았음에 오늘의 것이 내일의 낡은 것이 되어가고 사라져가고 잊혀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살았던 하루를 잊어가고 지워가고 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
어릴적 꿈 꾸었던 꿈도 청춘에 가졌던 열정마저도 살아가면서 이별해가는 것 들이다.
수많은 경험 중 이별이라는 경험은 늘 눈물과 후회 그리고 미련을 주고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그 중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다.

‘안녕’이라는 두글자에 이별하고 왠지 모를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진 듯 철퍼덕 주저 않고 만다.
특히 이별은 사랑했기에 가져야 하는 스스로의 몫이다. 하지만 이별이 가지는 진실과 거짓에 또 다른 사랑을 찾곤 한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이쯤에서 헤어져요”라는 말.
이런 이별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어느날 다가온 남녀의 이별은 그동안의 시간과 추억, 그들의 행동과 맹세가 아직도 기억속에 선명한데 그 모든 것이 허상의 순간이 되고 거짓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모든게 받아들이기 힘든 당황스러운 순간이 된다.
이별은 바로 오지 않는다. 분명 이별의 연습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다.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미칠듯이 괴롭고 스스로의 반성과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이해를 가지면서 말이다.
이별은 아프다. 그래서 아픈것은 아픈대로 두는 것이다. 목이 메이듯 차오르는 아픔들, 당연히 스스로가 가져야할 몫이다. 사람마다 슬플때 반응은 다르겠지만 담담해지는 순간을 빨리 하기 위해 그냥 삭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쥐어짜면서 까지 슬퍼해보고 그렇게 울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 놓은 연습. 이것은 이별에서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별에 대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힘듬을 털어놓는다면 그 또한 아픔을 배가 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별 후 눈물을 곁들인 술잔을 기울여보지 않은 사람이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픈 이별 뒤 심장의 박동수가 많아 아픈 심장 움켜쥐고 서글퍼 다시금 울어본 사람.
“사랑은 다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일년의 인연이라면 일 년이 지나고 난 후 그 인연은 모든 생명을 다하고 소멸하고 만다. 십년의 인연이라면 십년이 지난고 난 후 그 인연은 다한 인연이다.
그 이별의 아픔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사랑은 한다. 이것은 이별을 두려워하지만 사랑보다 이별을 더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이다.
사랑으로 인해 스쳐간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슬픔에 관해,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기쁨에 관해, 스스로 가졌던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우리는 인연과 어깨를 맞대고 세상과 삶을 위한 모든 순간에 충실하며 살았다. 그래서 이별을 한 것이다.

필자에게도 한 때 청춘이 있었다. 청아한 꿈을 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열정의 에너지도 있었다.
하지만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깨우치며 살지 못한 게으름과 이별을 고했다.
단지 시간에 따라 찾아올 봄을 그냥 그리워했을 뿐.
아직도 내 삶에는 하루종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느리지만 달팽이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제 내 마음도 이별의 산들바람에 아파하지만 세파의 스치는 바람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많은 이별을 고하고서야 얻은 결과물이다.
수많은 이별이 준 아픈 선물들이다. 천천히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고 고하고 그 이별을 위해 만남을 준비한다. 어제 목놓아 울었던 이별의 아픔을 뒤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