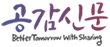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논문 작성의 시작이자 끝은 문헌연구 입니다.”
논문 작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근 『논문 작성 설명서』를 PDF 형식으로 무료 배포한 김진호 스위스 경영대학(SSM) 교수는 24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루첸스’라는 이름의 논문 컨설팅 홈페이지를 개설, 현재 운영 중이다. 이 홈페이지를 토대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2회에 걸쳐 무료로 제공한다. 일종의 재능기부다. 『논문 작성 설명서』도 이곳에 업로드했다.
김 교수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논문 작성자가 중요성을 간과하는 단계로 ‘문헌연구’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논문은 차별적인 공헌(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이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차별화된 공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문헌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학생이 기존 논문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문헌연구를 마치는데, 그건 문헌연구가 아니라 문헌연구를 흉내 낸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문헌연구의 목적은 내 논문의 차별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심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페이지를 읽지 않아도 좋은 논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논문 작성법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견해, 최근의 논문 심사 트렌드 등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논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목적에 맞는 논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사 학위 취득, 승진 등 목적을 분명히 해야 논문 작성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루첸스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 작성 설명서』 PDF 파일을 무료 배포하신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 해에 1만8000여 명이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한다. 학위를 받기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리고, 막상 박사학위를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 10만여 명이 논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틈틈이 『논문 작성 설명서』를 썼다. 그리고 이왕이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무료 배포 방식을 취하게 됐다.”
Q. 논문을 쓸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고민은 ‘주제 선정’이다. 좋은 주제를 고르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제 경우 박사 과정(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있을 때 최신 논문 다섯 편을 읽고 토론하는 훈련을 했다. 그게 수업이었다. 논문 작성자는 왜 이 주제를 선택한 건지, 부족한 점은 없은지, 시대적으로 필요한 논문인지 등을 늘 생각해야 했다. 매일 그 틀에서 남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어떤 게 좋은 논문인지 어떻게 써야 좋은 논문인지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더라. 이런 훈련은 주제를 선정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Q. 전공 분야의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인가?
“맞다. 최신 논문 10편만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해도 시야가 달라진다. 논문 한 편을 읽더라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지?’ ‘시야를 이렇게 비틀어 보면 어떨까’ 등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다.”
Q. 추가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 주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다. 10·20·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 1년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수만큼 자살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한 연구는 많이 없다. 챗 GPT도 재미있는 주제다. 내 전문 영역에 있어서 뭐가 재미있을까를 늘 생각한다면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Q. 『논문 작성 설명서』에서 “문헌연구가 논문 작성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차별적인 공헌이라고 한다. 인류의 지식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거 하나를 집어넣어야 한다. 만약 차별적인 공헌이 없다면 그 논문은 논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주제가 차별화된 공헌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기존의 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문헌연구를 하는 건데, 단순히 문헌을 뒤지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약을 하고 정리해야 한다. 어떤 게 빠졌고, 어떤 게 불일치되고, 어떤 건 왜 안 했고, 어떤 건 방법을 바꾸면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문헌연구를 논문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거다. 해외 저널은 논문을 심사할 때 서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성돼 있는지, 문헌연구가 논문의 차별적인 공헌을 잘 설득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사실 그것만 잘 돼 있으면 뒤는 거의 안 읽는다. 어차피 잘 했을 테니까….”

Q. 문헌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리뷰 논문을 이용하는 거다. 리뷰 논문은 약 10년간 일정 분야나 주제에 대해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 대신 문헌연구를 요약해주는 셈이다. 리뷰 논문만 싣는 저널도 있으니 잘 활용한다면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가로, 리뷰 논문을 리뷰하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 처음에는 초록과 서론만 읽는 거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압축해서 표를 보고 결론도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읽어야 할 논문의 수를 줄여가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 작성 설명서』에서도 두 챕터에 걸쳐 설명을 했다.”
Q. 만약 리뷰 논문에 없는 주제라면?
“읽을 게 없으니 삶이 편해지는 거다.(웃음) 다만 너무 어렵거나 필요 없는 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생할 준비는 해야 할 거다.”
Q. 논문 구성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학생(또는 연구자)들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델,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등은 논문을 좀 읽고 통계학을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뒷부분은 결과가 나온 걸 쓰기만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 강조했듯 문헌연구다. 논문을 보다 보면 남의 논문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많다. 그건 엄밀히 말해 문헌연구가 아니라 문헌연구를 흉내 낸 거다. 문헌연구는 내 논문의 차별성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부각시킬 구성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프레임을 짜야 한다. 심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페이지를 읽지 않아도 좋은 논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Q. 원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항상 있는 일)다. 이런 경우를 ‘서랍 가설’이라고 한다. 낮과 밤의 중간지대가 있다는 결과를 원했는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 낮과 밤이 전부인 거다. 그러면 논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랍에 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귀었는데, 막상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험이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서랍 가설이 될 확률이 적은 주제를 고르는 눈이 생기게 돼있다.”
Q. 논문 작성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이다. 인공지능은 똑똑한 하인이다. 챗 GPT도 쓸 수 있으면 잘 쓰면 된다. 다만 그걸로 완전한 논문을 기대하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한정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하인의 역할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물어보는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만 물어본다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해외 저널의 논문 심사 트렌드가 있다면?
“너무 큰 시장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구독 중심이었다. 1년씩 회비를 낸 사람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이 뻣뻣했다. 논문 하나를 내는 데 빠르면 1년~1년 6개월가량 걸렸다. 그런데 오픈 저널이 생겼다. 일주일 안에 첫 번째 노티스(Notice)를 준다. 그 뒤에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빠르다. 한 달 반이면 논문이 나온다. 대신 전 세계 누구나 원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처리한다. 그 비용은 논문 작성자의 몫이다. 두 저널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구독 중심 저널은 리뷰 프로세스의 퀄리티가 좋고, 권위가 높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대로 오픈 저널은 심사가 빠른 만큼 리뷰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저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잘 선택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실은, 오픈 저널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 중심 저널도 프로세스를 단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논문 작성자) 친화적으로 계속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Q. 해외 저널은 국내 사례연구를 잘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어떤가?
“원래 사례연구를 잘 안 실어준다. 사례연구를 실어주는 저널이 한두 개 있다고 해도 100개 논문 중 사례연구는 1~2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사례가 정말 의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 연구하고자 한다면 삼성이나 LG처럼 누구나 아는 사례를 들어야 한다. 사례 자체가 대단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면 된다.”
Q.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논문이란?
“이 세상에서 형용사가 붙는 건 다 상대적이다. 좋은 논문이라고 하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건지, 그 주체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 논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인지를 봐야 할 거고, 박사 과정 학생이라면 논문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일 것이다. 승진을 위해 논문을 쓰고 있다면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리는 논문이 좋은 논문일 테고 말이다. 결국 내 목적에 맞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는 생각이다. 목적의 서포트가 되는 거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김진호 교수 프로필
-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마케팅 박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빅데이터 석사·박사과정 설립, 운영
- 現 스위스 경영대학 한국대표, AI빅데이터 박사·석사과정 운영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통계 상식 백 가지』 『괴짜 통계학』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리더십』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사용설명서』 등 다수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