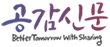[공감신문] 윤일원 칼럼니스트 = 어제 팔당댐 아래 칼 국숫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앉은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칸막이가 없는 식당이라 저절로 듣게 되니 어쩔 수 없었지.
우리나라 여배우 중 단연 최고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나도 좋아했지만,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CF 멘트까지 기억하고. 정말로 좋아했나 봐. 그러고 보면 인간은 감성이 가장 풍부할 때 유행한 배우가 머릿속에 각인되나 봐.
삶이란 마치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듯 해. 언제나 그 시대의 전성기 배우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고 우리는 쳐다보지. 그런데 우리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은 장면은 늘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장면이고. 그러니 세대별 좋아하는 배우가 다르지.
그렇게 각인된 것이 배우만이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아닐까? 의심해.
우리가 “저 친구는 좀 그래?” 할 때 그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 결정되었을까?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기준이 필요하잖아. 인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 학식, 재산 등등 모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고?

아니야. 사람뿐만 직장도 그렇게 각인되는 것 같아. 저 직장의 급여는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오너십 등등 이렇게 수많은 것의 평균선이 그어지고 그것이 평생 표준(norm)이 되는 것 같아.
여기에는 정치적 견해는 물론 역사관, 인생관마저 나름 기준선이 결정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어도 예전 그 기준 아래면 언제나 비난을 퍼붓는 건 똑 같아.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솜(Cogito ergo sum)'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 한다.”고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반성 없는 삶이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지나간 기차에 그어놓은 기준선을 늘 옳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

가장 큰 디폴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 진행되다 보니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비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해.
<천자문>에 이런 말 있는 거 알아? 제104구 ‘妾御績紡(첩어적방), 侍巾帷房(시건유방)’, “(밖에서) 아내와 첩은 길쌈을 하여 옷을 만들고, (안에서) 장막이나 방 안에서 수건으로 시중을 든다.” 삼선 평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고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 고대에 처첩이 시중들었다고? 지금 그랬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그래, 문명은 그렇게 변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알아차리지.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꽃잎을 살짝 흔드는 바람으로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야. 해마다 피고 지는 꽃은 잘도 관찰하면서, 과거 어느 시점에 결정된 디폴트는 한 번도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심 한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