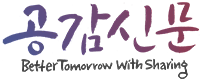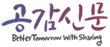2024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과거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이는 당시 빌 클린턴 후보가 대중의 경제적 불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승리했던 사례로, 오늘날 한국 상황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이는 기존의 잠재성장률마저 밑도는 수치다. 더욱 암울한 전망은 미국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서민 경제는 한계를 넘어 벼랑 끝에 섰다. 상가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13.8%를 기록하며, 비어 있는 점포가 일부 지역에서는 30%에 달한다. 비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무려 6만6천여 동에 이른다. 지역 상권의 쇠퇴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주택 시장의 한파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각각 8천506가구, 7천263가구에 달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은 급락하고 거래는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의 시급성을 모른 척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정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를 특정 정치적 인물과 사안으로 귀결시키는 논의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해법은 정치적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낙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삿짐센터, 도배·장판, 인테리어와 같은 관련 산업에 돈이 돌게 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증가한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돈이 순환하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필요하다.
정치가 답을 줄 수 없다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작은 실마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경제에 올인하는 정책과 실행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문제는 경제다." 이제 이 문구를 되새길 때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정체된 정치적 논쟁의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