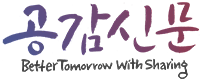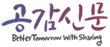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그에 이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우리 사회의 공권력 운용이 얼마나 쉽게 과잉으로 기울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지만, 법원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이 체포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의 체포가 과도했음을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확한 ‘체포 필요성’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없는 한, 체포는 형사절차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더구나 이 전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이자 사회적으로 명확히 신원이 확인된 인물이다. 경찰이 정당한 절차와 설득의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체포에 나선 것은, 공권력을 신중히 다뤄야 할 기관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체포가 집행된 시점 또한 의문을 낳는다.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직후 이뤄진 강제 체포는 ‘정치적 의도’나 ‘보복성 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오히려 공권력의 무게를 무분별하게 휘두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인신보호 차원이 아니다. 이는 “공권력은 법의 한계 안에서만 정당하다”는 헌법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단이다. 경찰이 체포를 남발하고, 법적 근거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국민 누구도 공권력 앞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절차상 하자와 판단 오류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체포영장 청구·집행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와 법률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남용될 때,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든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힘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일깨운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