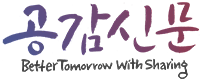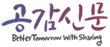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 한류시대 맞춰 국어문화원 예산 회복 촉구
국민 문해력과 공공언어 책임지는 최전선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한국어 배우려는 외국인 많지만 12년간 예산동결되어 사업 차질
안정적이던 용역사업들도 최근 40% 안팎으로 줄어 진행 어려워

훈민정음 반포를 기리는 9일 한글날, ‘한글의 현재’를 묻기 위해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원장은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이 국민 문해력과 공공언어를 책임지는 최전선”이라며 12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핵심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한류로 한국어 수요가 폭증한 ‘기회 창’이 열렸습니다. 기초 문해력과 공공언어를 다지는 국어문화원이 제 역할을 해야 교육·산업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12년간 동결된 예산으로는 국어문화원의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어문화원의 예선 증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슬옹 원장에 따르면 국어문화원은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후(설립은 2006년부터) 각 시·도에 설치되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전반의 언어 환경을 살피고 문해력 교육을 촘촘히 지원해 왔다.
“대학교 안에 있는 문화원들은 공간·기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지만, 세종국어문화원은 학내가 아닌 독립 기관이라 더 취약합니다. 국가의 지원금은 12년간 2천 3백만 원 내외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이던 용역 사업들도 최근 40% 안팎으로 줄며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산삭감 여파 “언론 협업 조사·공공언어평가, 차질”
김 원장이 가장 아쉬워한 것은 언론 협업 심층조사와 공공언어 평가·개선 사업의 축소다.
“공공언어는 행정 고지, 안내문, 홍보물 등 국민이 매일 접하는 언어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정확한 맥락으로 쓰여야 문해력이 자랍니다. 그걸 평가·개선하는 게 국어문화원의 본업인데, 12년간 2천 3백만 원으로 예산이 동결된 것은 큰 폭의 예산 삭감인 셈인 까닭에 인력과 조사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는 최근 공공·상업 홍보물에서 한글과 한자·영문을 뒤섞는 표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도시 광고나 일부 매체 지면에서 나라 이름, 사람 이름, 핵심 어휘를 한자로 병기하거나 바꿔 쓰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다문화·외국인에게 ‘한글 외에 다른 문자까지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을 줍니다. 공공언어의 기본은 쉬움과 일관성입니다.”

“한류로 커지는 한국어 산업…‘지금이 투자 적기’”
한자 교육의 효용을 묻자, 김 원장은 “배우는 것 자체를 막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해력의 핵심은 맥락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읽기·쓰기·말하기·듣기를 통해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조립하는 힘이 문해력입니다. 어원을 한자 뜻으로만 환원하면 오히려 의미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 독서와 글쓰기가 문해력의 뼈대입니다.”
그는 글로벌 ‘K’ 열풍으로 한국어 수요, 한글 콘텐츠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다문화 가정의 문해력 지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국어문화원이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어와 관련된 사업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한국어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어 정책 과제로 옛한글(훈민정음) 디지털 입력·검색·표현성 개선, 한글 기반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꼽았다.
“모바일·플랫폼 환경에서 옛한글은 입력도 불편하고 검색도 어렵습니다. 학술·문화유산을 대중과 다시 연결하려면 표준화와 도구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AI가 학습하는 한글 데이터도 쉬운 표현·명확한 문장으로 다듬어야 공공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한글의 힘은 ‘섬세한 표현력’…기초부터 다지자”
인터뷰 말미, 김 원장은 한글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글의 힘은 섬세한 표현력입니다. 국민의 문해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학교 밖의 시민 문해력 교육을 촘촘하게 뒷받침하는 국어문화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합니다. 한글날에 ‘한글로 더 잘 살자’는 약속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지금 예산 회복이 필요한가요?
“한류로 한국어 수요가 폭증한 ‘기회 창’이 열렸습니다. 기초 문해력과 공공언어를 다지는 국어문화원이 제 역할을 해야 교육·산업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 삭감으로 어떤 사업이 멈췄습니까?
“언론 협업 심층조사, 공공언어 평가·개선 사업의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역 공공 안내문, 행정 고지, 홍보물 점검을 촘촘히 못 합니다.”
- 이중 문자 문제, 왜 심각합니까?
“우리말의 일관성을 해치고, 외국인·다문화 학습자에게 장벽이 됩니다. 공공언어는 쉬워야 합니다. 기본은 한글이고, 필요한 경우 보조 표기여야 합니다.”
- 문해력 교육의 핵심은?
“맥락 이해입니다. 독서·글쓰기로 상황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자 조기교육이 문해력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 앞으로의 연구·사업 계획은?
“옛한글의 디지털 활용성 개선, 한글 데이터의 품질 관리, 시민 문해력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준비 중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현실화됩니다.”
한글은 쉬움과 정확함, 그리고 섬세함으로 세계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쉬운 말’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 한글날, 김슬옹 원장의 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국어문화원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국어문화원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해력과 한국어와 한글로 여는 미래 문화 사업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로, 국어학·국어교육학·훈민정음학 박사 3개 학위를 취득한 한글 전문가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학회를 통해 한글운동을 시작하여 47년간 활동해 왔으며, 1984년 '동아리'라는 말을 최초로 보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저서 123권과 논문 147편을 발표했고, 제40회 세종문화상 대통령상(2021), 제38회 외솔상(2016) 등을 수상했다. 2018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글으뜸지킴이로 선정되는 등 한글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