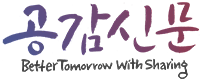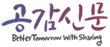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부패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수천억 원대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대표적 공공개발 비리 사건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개발 이익이 소수 민간에게 돌아간 구조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상징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유는 불분명하고, 과정은 혼란스럽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를 비롯한 일당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고 환수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 등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며 내부 의견 불일치를 드러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다시말해 항소 포기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은 셈이다. 그것이 법리 판단이었든, 정치적 고려였든, 국민의 눈에는 “힘 있는 사건일수록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오래된 불신만 남았다.
국가의 대표적 반부패 사건에서 이런 불투명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책임성과 독립성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의의 일관된 기준이다. 검찰은 항소 포기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조직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을 다루는 기관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인은 진영에 따라 논평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 이름으로만 말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시험대다.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은 ‘결과’보다 ‘진실에 이르는 절차의 정직함’이다. 그 절차가 무너진다면, 어떤 판결도 정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