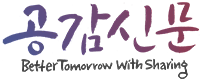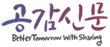잘 쉬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경한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은 직장인, 아침형 인간을 넘어 새벽형 인간을 자처하는 자기계발서. 이런 풍경들은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바뀌고 있다. ‘많이 일하는 사람’보다 ‘잘 쉬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과로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력의 양’으로 성과를 측정해왔다. “열심히 하면 된다”, “죽도록 하면 된다”는 말은 산업화 시대에는 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쟁은 ‘노동 시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는 집중력, 창의력, 회복력이 핵심이다.
애플(Apple)의 팀 쿡(Tim Cook)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잠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루틴 속의 회복 구조’다. 그는 명상과 산책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역시 “나는 하루 8시간 수면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쉬는 능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고성과를 위한 전략적 무기다.
뇌는 ‘쉬는 동안’ 일한다
신경과학의 연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조차 쉼 없이 일한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뇌 안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정보 정리와 연결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과학자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라 부른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멍하니 있을 때, 혹은 산책 중에 생각이 풀릴 때,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뇌는 하루 동안 쌓인 기억과 정보를 정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새롭게 엮는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집중할 때보다, 오히려 손을 놓았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즉, 휴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일’의 시간이다. 우리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생각의 방향을 재정렬하고, 창의적 통찰을 얻는다. 그러므로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사고를 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순간이다.
일을 멈추는 순간, 뇌는 정보를 재조립하며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Google), 넷플릭스(Netflix), 나이키(Nike)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생산적인 휴식’을 장려한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최고의 투자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수면은 단순한 피로회복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과정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전문가 매튜 워커(Matthew Walker)는 자신의 저서 ‘Why We Sleep : The New Science of Sleep and Dreams(2017)’에서 특히, 수면 부족이 마치 술에 취한 상태와 같아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수면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기억 정리, 학습 능력 향상, 감정 조절, 면역력 회복 등 ,인간 건강과 인지 기능 전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CEO들이 수면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자고 회복된 상태로 하루를 맞는 것이다. 결국, 잠을 줄여 얻은 시간은 생산성이 낮아진 시간으로 되돌아온다.
‘쉬는 기술’이 경쟁력이다
휴식에도 기술이 있다. 단순히 누워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 규칙적인 산책,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잠시 멀리하고 다른 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행위), 주말의 완전한 오프라인 시간 등은 모두 의식적으로 설계한 회복의 시간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력–회복 이론(Effort–Recovery Theory, Meijman & Mulder, 1998)로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정 시간 일하는 동안 생리적·정신적 긴장이 쌓이고, 휴식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신체와 마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만, 휴식 없이 일만 지속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피로는 누적되어 만성화된다. 즉, 일과 회복의 균형이 건강과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진짜 효율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은 ‘리듬’의 중요성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빠르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의 오르내림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포모도로 방식(Pomodoro Technique, 짧은 집중 작업과 휴식을 반복해 뇌와 몸의 에너지 리듬을 최적화하는 시간 관리 기법, 일반적으로 25~50분 집중 후 5~10분 휴식을 취하며, 일정 주기마다 긴 휴식을 갖는 구조를 따름)’은 단순한 시간 관리법이 아니라 ‘생리적 리듬’에 근거한 시스템이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워밍업’과 ‘쿨다운’을 하듯, 지식노동자도 집중과 회복의 리듬을 조율해야 한다. 쉬는 리듬이 무너지면, 일의 질도 무너진다.
일의 완성은 ‘멈춤’ 속에서 온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기 전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잠시 멈추고 바라보면, 자신이 놓친 부분이 보인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 배웠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멈춤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루의 끝에서 잠시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휴대폰을 끄고, 한 달에 하루는 스스로를 ‘비우는 날’로 삼는 것. 이런 작은 쉼의 습관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자기관리의 품격’을 만든다.
결국, 휴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잘 쉰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다. 이는 곧 자기 효율성과 자기존중의 표현이다.
오늘날 ‘휴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성공의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다. 쉼 없이 달리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취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잘 쉬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그것이 오늘날의 진짜 자기관리다.
김성수(現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