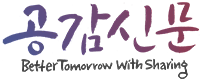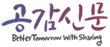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 저널리즘의 책무는 명함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 발행인·편집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책임을 모른 채 타이틀만 쓰지 말아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토와 인구 규모에 비해 언론사가 지나치게 많다. 인구 5천만 명, 국토면적 10만㎢의 나라에 2만 7천여 개의 정기간행물이 존재한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 1,850명당 언론사 하나꼴로,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2016년 기준 6,605개가 등록 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만 해두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유령 언론사'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명함에 언론사 대표 타이틀 달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언론사 간판 하나가 곧 권위나 영향력을 증명해주는 수단처럼 여겨지는 기형적인 풍토다.
최근 필자의 경험담 하나를 나누고 싶다. 어떤 강연이나 모임에서 만난 이들의 프로필에는 흔히 '언론사 운영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언론사를 찾아가 보면 자기 홍보성 콘텐츠 위주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급조된 매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콘텐츠의 주기적 업데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짜 언론인지 아닌지는 금세 알 수 있다. 특성화 언론이나 월간지, 계간지처럼 발행 주기가 길더라도 기사 톤, 문제의식, 편집 방향만 봐도 언론사다운 무게가 느껴지기 마련이다.
저널리즘의 최소 기준은 분명하다. 사실 확인 없이는 한 줄도 못 쓰고, 오보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취재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생명이 위협받고, 권력을 감시하는 본업 때문에 밤샘 검증과 법정 공방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은 그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짊어지는 영역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권위를 빌려오기 위해 언론사 타이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언론사 발행인·편집인이라는 직함은 단순 간판이 아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심지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척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하는 순간, 사회적 신뢰는 무너진다.
이런 '권위 확보용 언론사'의 등장은 결국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언론의 신뢰를 빌려 쓰면서도 저널리즘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에, 정보 시장은 혼탁해지고 소비자와 독자는 피해자가 된다.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의 경계가 흐려지면, 공론장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받는다.
대안은 단순하다. 정말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보 정기 기고', '△△전문지 편집위원'처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된다. 그것이 진짜 언론 활동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언론사 운영'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는 순간, 그 타이틀은 신뢰가 아니라 기만으로 작동한다.
언론사 타이틀은 명함의 장식품이 아니다. 저널리즘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언론사 대표라는 타이틀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권위를 포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무겁고도 절박한 책임 그 자체다.
![[글] 이우람 PR펌 바다와하늘처럼 대표 · 전 문화뉴스 편집인](https://cdn.gokorea.kr/news/photo/202509/840181_117077_3949.jpg)
- "차이나 아웃" 외치는 순간, 한국 브랜드가 무너진다
- 조국혁신당, 강미정 사태…위기 관리라는 단어도 모르는가
- 품격 있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국가 브랜드를 만든다
- 스포츠 응원가, 정치가 건드려선 안 될 성역
- 중국인 간첩 99명은 어불성설, 가짜뉴스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
- 2025년 추석, 영포티의 역할은 '세대 번역자'
- 침묵을 깬 쯔양, 이제 답할 차례는 국회다
- '설마 우리 회사가?' 산업재해는 커뮤니케이션 실패에서 시작된다
- 바다와하늘처럼-사사모, 스타트업 홍보 지원 손잡았다
- 양양군 가혹행위 사건이 드러낸 것…'개인의 일탈'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