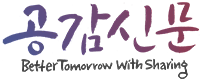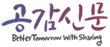노무 관리가 아니라 '듣지 않은 메시지'가 생명을 앗아간다
홍보실과 경영진이 배워야 할 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경고를 듣는 감수성이다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내놨고, 노동부는 과로와 장시간 근무를 막아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설마 우리 회사가?'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반복되는 사이, 또 한 명의 청년이 일터에서 쓰러졌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신호가 있었다. 현장의 피로, 근무표의 비정상적인 스케줄, 익명 게시판의 호소, 직원 간 대화 속의 작은 단서들. 그러나 이 경고음은 늘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조직의 언어 속에 묻힌다. 결국 회사는 위기가 닥쳐야만 현실을 인식한다.
이건 노무 관리의 실패이자, 더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다. 경영진은 위기 때마다 대응문을 준비하지만, 진짜 위기는 '듣지 않은 메시지'에서 시작된다. 현장의 이야기가 위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편한 보고가 걸러진 채 사라질 때, 조직은 스스로 경고를 차단한다.
홍보실은 브랜드 스토리를 관리하지만, 정작 조직의 현실을 관리하지 못할 때 위기는 커진다. 좋은 브랜드는 말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는 회사에서 나온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감성 마케팅도 결국 진정성을 잃는다.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조직 전체에 있다. 정책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우리의 일'로 받아들인 조직은 많지 않다. 이 간극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익명 제보 시스템, 정기적 현장 간담회, 근무 데이터 모니터링 같은 구체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홍보실과 대표가 배워야 할 것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감수성'이다.
경고를 듣고, 불편한 말을 기록하며, 문제의 조짐을 미리 포착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역량이다. 조직의 평판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근무표와 퇴근시간, 그리고 구성원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브랜드가 감성을 말하려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다치고 죽는 순간, 그 감성은 모두 거짓이 된다. 산업재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부재'의 결과다.
설마 우리 회사가?
그 말은 언제나 사고가 나기 직전에 등장한다. 이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조직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경고를 듣고 있었는가.
![[글] 이우람. PR펌 바다와하늘처럼 대표 · 전 문화뉴스 편집인](https://cdn.gokorea.kr/news/photo/202511/844954_122057_31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