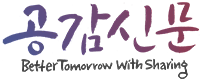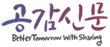공공조직의 침묵은 어떻게 폭력을 정상화하는가
뒤늦은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면역체계'
가장 위험한 말은? '설마 우리 조직에서는!'
강원 양양군에서 벌어진 7급 공무원의 가혹행위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이 사안은 한 사람의 일그러진 행동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 체계가 어디에서 멈춰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고, 스스로를 교주라 부르게 하며, 주식 매수를 강요하고,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위협까지 이어졌다는 보도는 가혹함을 넘어 학대에 가깝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는 점이다.가해자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아무도 멈추지 못한 구조가 문제였다.
폭력은 조용히 자라지 않는다. 폭력은 대부분 혼자서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치챘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쌓여 조직문화가 된다.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초기 감지'다. 누군가의 권력이 사적 공간에서 비틀릴 때, 그 일그러짐이 조직 전체의 침묵을 통해 증폭될 때, 그때 비로소 공공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양양군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수개월간 고통받도록 방치된 까닭은, 가해자의 괴이한 행위보다도, 그 행동을 막아내지 못한 구조적 결함에 더 가까워 보인다.
양양군은 무관용 원칙, 가해자 분리, 전수조사,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발표했다.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사건 뒤에 발표되는 '대책'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동해야 하는 '면역체계'에서 결정된다.
조직문화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조,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 권력이 비틀릴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이것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조직은 건강해진다.
많은 공공조직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설마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조직은 가장 사각지대에 가까워져 있다.
양양군의 사건은 양양군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조직이 다시 기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폭력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그 폭력은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명의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문화 교체'다.
누구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누구도 권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구조의 복원이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된다.
![[글] 이우람 PR펌 바다와하늘처럼 대표 · 전 문화뉴스 편집인](https://cdn.gokorea.kr/news/photo/202511/847879_125075_848.jpg)